 |
행 복 학
“당신은 행복합니까?”
요즘 이렇게 물으면 “행복합니다” 라고 선뜻 대답할 사람은 드물 것 같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다락같이 오르지, 내 집 장만할 길은 요원하지, 기름값 올라 차 몰기도 겁나지, 대학 등록금은 천 만원 대를 넘보지, 취업난에 대학 졸업조차 망설여지지....
어디 일반 국민 뿐이겠습니까. 공천 심사에 탈락하여 선량의 길을 접어야 할 정치인, 정부 조직개편으로 자리조차 얻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공무원, 특검 수사로 벌집이 된 재벌의 오너 일가와 임원, 국회 청문회의 질타에 도로 갓을 벗어야 하는 고위 공직후보들....
허파가 뒤집히는 분노와 허탈과 절망감으로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수두룩할 것입니다.
이런 판국에 서울대가 올 1학기부터 국내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행복학’ 강의를 개설했다고 합니다. 행복이 어떤 것인지, 행복학은 무엇을 담고 있는지 언뜻 감이 오지 않지만, 분노를 달래주고 허탈감을 위로해 주고 절망에서 구제해 준다면 행복이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강의를 담당할 교수들도 “행복 이론을 만들기 보다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목적” 이라고 하니 기대가 커집니다.
때마침 친구 한 명이 E-mail로 “인생 후반기 40여 년을 행복하게 살았다”는 미국의 어느 재벌 이야기를 보내와 소개할까 합니다. 33세에 백만장자가 되고, 43세에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되고, 53세에 세계 최고 갑부가 된 록펠러(1839-1937)의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석유재벌 록펠러는 55세 되던 해에 불치병으로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검진을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가는 그의 눈에 병원 로비의 액자에 실린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우리들 장삼이사도 다 들어 본 소리입니다.
그러나 록펠러는 그 글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전율이 일고 눈물이 났습니다. 뭔가 깨달음을 주는 신선한 기운이 온 몸을 감싸는 가운데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때 병원 접수창구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어린 소녀의 어머니가 울면서 딸을 입원시켜 달라고 애원하자, 병원 측은 돈이 없으면 입원이 안 된다며 다투는 소리였습니다.
록펠러는 바로 비서에게 모녀가 눈치채지 못하게 입원비를 주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시켰습니다. 뒷날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되자 그 모습을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던 록펠러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다”라고.
록펠러는 그 때부터 나눔의 삶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신기하게도 병까지 나아 98세까지 살며 자선사업에 힘썼습니다. 1890년 이후 시카고대학 설립을 위해 4억1천만 달러를 기부했고, 록펠러 재단과 의학연구소도 설립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다”고 회고했습니다.
있는 자가 돈을 쓰는 일이 뭐가 어렵느냐고 묻는 이도 있을 겁니다. ‘뒤주가 차야 정도 나온다’는 옛말처럼. 그런데 우리 주변은 그렇지 않은 듯 합니다. 있는 자의 주는 뜻이 바느질 할머니, 김밥 할머니들의 몇 백 만원 보다 깨달음이나 선심 면에서 모자라는 것 같아서입니다.
피뢰침을 발명한 미국의 정치가이자 과학자인 벤자민 프랭클린(1706-1790)은 행복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욕망을 줄이거나 소유물을 늘리는 것이다” 새 정부의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 발탁 인사들이 하나같이 소유물이 많은 데도 욕망을 줄이고 싶지 않은 것을 보면 행복은 누구에게나 찾아 오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필자소개
김홍묵
동아일보 기자, 대구방송 이사로 24년간 언론계에 몸담았다. 이후 (주)청구 상무이사,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 (주)화진 전무이사 등을 역임했다. 언론사 정부기관 기업체 등을 거치는 동안 사회병리 현상과 복지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기사와 기고문을 써왔으며 저서로는 한국인의 악습과 사회구조적 문제를 다룬 '한국인 진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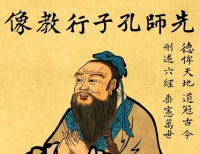 세상에 쓰인다면 자신의 이상을 실천하고 ,,,
공자[孔子]께서 안연[顔淵]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에 나서 쓰인다면 자신의 이상을 실천하고 만일 쓰이지않는다면 자신의 재능을 감출수 있어야 하거늘 아마도 너와 나만이 그렇게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 하셨다, 용지측행 [用之則行] 사지측장 [舍之則藏]유아여이...
세상에 쓰인다면 자신의 이상을 실천하고 ,,,
공자[孔子]께서 안연[顔淵]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에 나서 쓰인다면 자신의 이상을 실천하고 만일 쓰이지않는다면 자신의 재능을 감출수 있어야 하거늘 아마도 너와 나만이 그렇게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 하셨다, 용지측행 [用之則行] 사지측장 [舍之則藏]유아여이...
 상월면 주내 사거리 흉물 방치 폐가 마침내 철거
십 수년을 두고 흉뮬스러운 모습으로 방치돼 오가는 길손들의 빈축을 샀던 논산시 상월면 주내 사거리 빈집에 대한 철거 작업이 시작됐다, 2,3일 후면 말끔히 정비될 전망이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만시지탄이지만 뒤늦게라도 토지주를 설득 철거에 나선...
상월면 주내 사거리 흉물 방치 폐가 마침내 철거
십 수년을 두고 흉뮬스러운 모습으로 방치돼 오가는 길손들의 빈축을 샀던 논산시 상월면 주내 사거리 빈집에 대한 철거 작업이 시작됐다, 2,3일 후면 말끔히 정비될 전망이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만시지탄이지만 뒤늦게라도 토지주를 설득 철거에 나선...
 시민공원 족욕체험장 " 인기몰이" 시민들 반색
논산시가 공설운동장과 시민공원 사이 녹지공간에 마련한 족욕 체험장이 시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당초 야외 족욕 체험시설로 출발한 체험장은 날씨가 추운 동절기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바람막이 외벽과 비가림 시설을 완비하면서 부...
시민공원 족욕체험장 " 인기몰이" 시민들 반색
논산시가 공설운동장과 시민공원 사이 녹지공간에 마련한 족욕 체험장이 시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당초 야외 족욕 체험시설로 출발한 체험장은 날씨가 추운 동절기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바람막이 외벽과 비가림 시설을 완비하면서 부...
 10월 12일 강경 젓갈축제 3일차 표정 [2]
강경 포구 둔치에서 열린 2018년도 강경 젓갈축제 3일차 표정을 한광석 굿모닝논산 사진 편집위원이 카메라에 담았다,
10월 12일 강경 젓갈축제 3일차 표정 [2]
강경 포구 둔치에서 열린 2018년도 강경 젓갈축제 3일차 표정을 한광석 굿모닝논산 사진 편집위원이 카메라에 담았다,
 여걸[?]의; 등장 ,이인제 도지사 후보 부인 김은숙 씨
충남도지사 선거에 입후보한 이인제 예비후보의 부인 김은숙 씨가 어린이날을 기념한 논산시 어린이 큰잔치가 열리는 시민공원을 찾아 시민들에게 이인제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날 김은숙 여사의 논산 방문 일정에는 자유한국당 논산시의원 비례...
여걸[?]의; 등장 ,이인제 도지사 후보 부인 김은숙 씨
충남도지사 선거에 입후보한 이인제 예비후보의 부인 김은숙 씨가 어린이날을 기념한 논산시 어린이 큰잔치가 열리는 시민공원을 찾아 시민들에게 이인제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날 김은숙 여사의 논산 방문 일정에는 자유한국당 논산시의원 비례...

